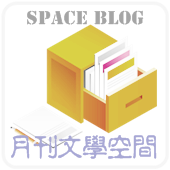우측에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회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회원님의 글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는 운영자 혹은 메뉴에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 신청을 해주세요.
엄원용
상왕산 기슭 개심사의 가을 해질녘, 멀리 서해 앞 바다로 뉘엿뉘엿 떨어진다.
지는 해는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여기 앞 3층 석탑을 마지막으로 비추고는 사라진다. 이제 산사는 고요히 정적 속에 잠들 것이다.
스님 두어 명이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대웅전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들리는 독경소리. 어둠에 잠들려든 산천도 초목도 모두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인다.
나도 뜰 앞에 서서, 어쩌면 심오한 소리인 것도 같고 신비한 소리인 것도 같아 그저 귀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서 이름 모를 밤새 한 마리 긴 소리를 내며 내 앞은 휙 지나간다. 그것도 모르느냐고 깨우치는 말도 같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꾸짖는 것도 같았다.
독경소리에 밤은 점점 깊어만 갔다.
201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