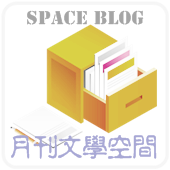우측에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회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회원님의 글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는 운영자 혹은 메뉴에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 신청을 해주세요.
눈 길
엄원용
어머니를 땅에 묻고 오던 날
날씨는 얼어붙어 너무 춥고,
싸락눈까지 날려 잡아먹을 듯이 사나웠다.
돌아오는 길에 개울은 얼음으로 덮여 미끄러웠고,
1월 보리밭의 겨울 푸른 싹들은
눈 속에 모습들을 감추고 흰 세상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얀 벌판 위에
정신없이 발자국 하나씩 찍으며 길을 내면
내 뒤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뒤돌아보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길과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하나의 길을 뒤로 한 채
다른 하나의 길은 다시 마을로 이어지고
공허한 가슴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마을로 통하는 길로 들어서야만 했다.
겨울 차가운 언 땅속 깊이 홀로 묻혀
이승과 저승으로 서로를 갈라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저 어느 저 편 눈이 날리는 희뿌연 하늘 아래
그 차가운 곳에 홀로 남겨두고 온
아홉 살 어린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상실의 마을은 처음으로 낯설기만 한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흰 눈의 정적 속에 파묻혀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정말 매정하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보이는 집과 나무들도 그대로 있었고
여느 때처럼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발자국은 떨어지는 눈물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