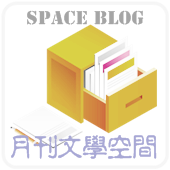우측에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회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회원님의 글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는 운영자 혹은 메뉴에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 신청을 해주세요.
엄원용
나무와 나무, 작은 잡목들 사이에서
홀로 우뚝 서서
한 때는 푸른 빛깔로
무성하게 온 몸을 장식하던
저 늙은 떡갈나무가
어느 때부턴가
그 눈부시던 욕망의 빛깔들을
바람에 하나 하나 떨쳐버리고
차가운 겨울 밤안개 속에서
죽은 듯 산 듯
조용히 세월을 맡기고 서 있었다.
그 때 비로소 나는 보았다.
오랜 세월 견디고 나서
온갖 풍상에 다 드러낸
全裸의 부끄러운 몸짓으로
의연히 서 있는 저 원시의 古木.
그것은 하늘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월을 기다리고 계신 늙으신 아버지였다.
이제는
숲속 여러 雜木들 사이에서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숙연히 침묵하고 있는
저 고독한 늙은 떡갈나무.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