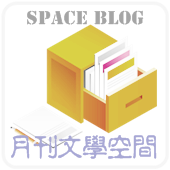우측에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회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회원님의 글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는 운영자 혹은 메뉴에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 신청을 해주세요.
엄원용
나는 안다.
지금도 누군가 나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엮고 있다.
그는 벌써 나를 두 번 암에 걸리게 했고,
세 번 수술하게 했다.
한 번 이혼하게 했고,
지금은 혼자서 살게 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빠로 혼자서 키우기가 너무 외로워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독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는 지금 평범한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언제 또 거기에서 그만 두게 할지도 모른다.
‘해고’ 두 글자만 종이에 쓰면 된다.
이 무저항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으나 그 마저도 할 수가 없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 앞으로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그가 소설을 마무리를 지으면
나의 인생도 주인공의 운명처럼 끝이 난다는 것.
멋있게 끝이나 맺어달라고 말하고 싶다.
내 삶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픽션이 아닌 팩트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픽션과 팩트의 이 모호한 경계에서 헤매고 있다.
2013. 1